캐나다의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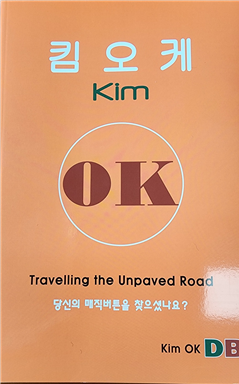
캐나다에 온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나는 밴쿠버로의 이전을놓고 부산하게 에드먼턴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에드먼턴을 떠났다. 한국에서 올 때처럼 이민 가방 2개에 다시 내 희망을 담고는 병애 언니의 차에 몸을 싣고밴쿠버로 행했다. 마침 병애 언니는 신혼여행을 겸해서 남편과 함께밴쿠버로 여행을 갈 계획이어서 나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차비 한 푼도 안 들이고 가게 된 밴쿠버행은 그러나 순조롭지 못했다. 2시간쯤 달렸을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 차에서 내려 혼자 버스를 타고 밴쿠버에 들어와야했다.
밴쿠버 버스 터미널에서 약 2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희정이 소개시켜 준 그녀의 친구, 시나 트림블이라는 아가씨가 뒤늦게 날 데리러 왔다. 밴쿠버의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암시인 것 같아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에드먼턴을 떠나기 전 나에게 자기 방에서 1주일은 재워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기간 안에 내 거처를 찾으면 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녀를 만나고 보니 사정이 달라져 있었다.
3일 후에 자신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그 이후엔 어디서 묵는단 말인가. 나는 가방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소파에 쪼그리고 누웠다. 잠이 올 리 만무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다음날, 다급해진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혹시 밴쿠버에 아는 한국 사람이 있어?”
그녀는 자기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두리네’라는 가족이 있다고했다. 나는 전화번호를 건네받아 곧바로 전화를 했다. 염치도 체면도 나에겐 허영에 지나지 않았다. 뜻밖의 한국 사람으로부터 전화를받은 두리네는 침실이 하나인 아파트에 딸아이와 부부가 살고 있어나를 재워 줄 수 없다며 미안해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한국인 부부가 있는데 아마 그분들 정도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런데 그분이 대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이 들었다. 김성학, 내가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바로 그이름이었다.
동명이인이 아닐까 염려하며 전화를 걸었다. 자동 응답기가 돌아갔다.
응답기 속의 목소리로는 분간이 어려웠다. 밤 10시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김성학 씨는 바로 내가 알던 그 김성학 씨였다. 내가알 때는 총각이었던 그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부인과 함께 유학생신분으로 밴쿠버에 살고 있었다.
고맙게도 김성학 씨는 차를 몰고 내가 묵고 있는 밴쿠버 시내까지 나를 데리러 와 주었다. 그의 집은 다운타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버나비 메트로타운에 있었다.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하나는 부부가, 다른 하나는 처남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 여름인 7월, 3일 밤을나는 김씨네 집에서 지냈다. 거실에다가 풀지 않은 이민 가방 2개를세워 놓고 카펫 바닥에서 잠을 잤다.
김씨 부부는 나를 편하게 대해 주었다. 그들은 또한 나랑 동갑이어서 더욱 편했다. 이들 부부가 내게 만들어 준 요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동안 나는 언제나 흰밥에 오이 피클, 그리고계란 프라이만 먹었다. 어쩌다가 소시지를 먹는날에는 황후의 상을받은 양 풍성하게 느껴졌다. 물론 식량이 떨어져 굶는 날도 있었다.
진심을 다해 대하는 이들 부부의 태도는 결과적으로는 나를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자상한 배려가 너무 미안해서 무작정 버틸 수가 없었다. 나는 3일 밤을 자고 난 후 수첩을 꺼내 들었다. ‘트레이시’ 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에드먼턴에서 친하게 지낸 나의 룸메이트인 셜리의 친구로 에드먼턴에서 처음 만났다. 칼스턴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밴쿠버로 간다
고 하니까 자신도 그곳으로 간다며 오게 되면 룸메이트를 하자던 말이 떠올랐다.
“트레이시, 나 셜리 친구 옥란이야. 너 아직 룸메이트 찾고 있니?”
“그래, 잘됐다.”
“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
“그래, 여긴 우리 오빠 집인데 방 구할 때 까지 와 있을래?”
저녁 8시에 트레이시의 자동차가 도착했다. 나는 그녀의 차 트렁크에 2개의 이민 가방을 옮겨 실으며 이제 밴쿠버에서의 내 방황이끝날지 모른다는 기대에 차 있었다.
트레이시 오빠의 집은 버나비 김성학씨 집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써리라는 곳에 있었다. 작은 규모의 그 집은 1층과 지하실로꾸며져 있었다. 내가 머물 지하실은 방 하나와 거실이 있었다. 방안은 침대와 조그마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여전히 이민 가방을 풀지 못한 채 트레이시와 나는 함께 살 방을 구하는 데 신경을 바짝 썼다. 지리도 모르는데다가 자동차도 없는 나로선 트레이시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며 돌아다닐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방을 찾는 작업도일을 마친 트레이시가 집에 돌아오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움직일수 있었다.
아침에 집 안의 모든 식구들이 직장으로 나가면 나는 지루함과막막함을 달래기 위해 집 앞 덩굴에 흐뜨러져 있는 블랙베리를 따면서 시간을 보냈다. 지천으로 널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않는 블랙베리를 가득 따다가 두고두고 먹었다.
1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무료하게 흘렀지만 방을 구하지는 못했다. 나는 또다시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을 내놔야 하는 상황을 맞고 말았다. 유콘에 살고 있는 트레이시 부모님이 아들 집을 방문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지하 방에 앉아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나마 익숙한에드먼턴으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생활비도 밴쿠버보다 싸니까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곳으로 고작 2주일 만에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다.
킴오케 오늘의연재 관련 상담문의 조윤수 010-2844-0675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